
[2020-03-22] [칼럼]한상백의 돌출입, 양악 이야기 <89회>: 참을 수 없는 직언의 어려움
참을 수 없는 직언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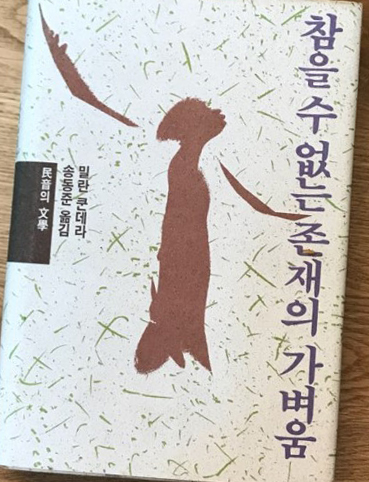
(밀란쿤데라의 소설. 참을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표지)
수술장 입구에는 그 날 수술하기 위해 카트(환자를 옮기는 바퀴달린 침대)를 타고 내려온 몇몇 환자들이 기본적인 체크를 받고 있었다. 카트는 ‘아저씨’가 밀고 끌어서 환자용 엘리베이터로 내려온다. 필자가 S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를 할 때니, 꽤 오래전 이야기다. 지금은 아저씨가 아니고 이송원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송원이 수술장 입구까지 환자 침대를 끌고 내려오면, 수술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인턴(의사면허를 딴 지 1년 이내의 수련의사)이 환자침대를 수술방까지 끌고 가는 구조다. 침대를 잘 운전하는 법은 의대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인턴은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
리셉션에서 아저씨로부터 차트를 넘겨받고 환자를 확인하는 낯선 간호사는 일이 서툴렀다. 신규였다. 자그마한 체구의 간호사는 환자 확인 후 리셉션에 앉아 차트에 기입을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을 주는 일을 반복했다. 처음이라 일이 늦어, 주치의인 필자도 한참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보통 환자 옆 카트에 서서 기다리는 평소 풍경과는 달리, 그날따라 이송원들이 리셉션 앞을 왔다 갔다 했다. 한 이송원이 씨익 웃으며 벽쪽으로 물러나면 이내 다른 이송원 아저씨가 눈치껏 리셉션 앞으로 간다.
무슨 일일까 하여, 젊은 필자도 리셉션 앞으로 가보았다.
아뿔싸.
상의의 V넥을 통해 신규 간호사의 옷 속이 남김없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과장하자면 배꼽까지 보일 지경이었다. 아찔했다. 자그마한 체구의 신규간호사에게는 S사이즈의 수술복 상의도 너무 컸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수술장 간호사들이 V넥 부분을 겹쳐 접어서 옷핀이나 클립 혹은 테이프로 봉한다.
이송원들이 리셉션 탁자 앞을 어슬렁거렸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순간, 본능적으로 젋은 필자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직언이었다. 최대한 볼륨을 낮춰, 최대한 젠틀하게, 그러나 최대한 이건 수작거는게 아니라는 기름기 뺀 말투로 말했다.
-저기, 저...아저씨들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지금 옷이 커서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클립하나 하시는 게 좋겠어요.
순간, 얼굴이 발그레해진 신규간호사는 순간적으로 옷 품을 손으로 가리면서, 흰 의사가운에 새겨진 내 이름을 잠시 응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신규여서 잘 몰랐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한 선생님에게도 다 보였을 테니,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언제 시간되세요?
이랬으면 좋으련만, 그 반대였다.
당황한 간호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수술장 안으로 들어가 바로 차지 간호사(책임 간호사)에게 가서 일러바쳤다. 차지 간호사가 날 좀 보자고 했다. 차지 간호사와 젊은 필자는 물론 이미 잘 아는 구면이었다. 신규에게는 한선생님이 도와주려 한 것이라고 잘 말해두었다면서, 옷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상황을 중단시켜준 것은 감사한데, 다음에는 옆에 있는 다른 여자 간호사에게 귀띔해주면 더 고맙겠다고 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던 차지는 젊고 철없던 필자에게 직언의 기술을 한 수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필자도 옆 사람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찔한 장면을 본 순간, 젊은 필자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앳된 신규간호사가 눈요기감이 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돈키호테적 기사도 정신(quixotism)이 발동했고 그래서 직언이 튀어나왔다. '나는 너의 옷 속을 아저씨들이 돌아가며 구경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널 보호하고 싶다, 난 네 편이다'라는 의인 코스프레였을 수도 있다. 그녀는 갓 스물 두 살쯤이었고 필자도 피가 끓는 이십대였다. 서툴렀지만 필자는 그래도, 그냥 방치하고 모두가 눈요기하는 편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요즘 사회 분위기라면 더 신중했어야 할 것이다. 그녀를 보호한답시고 직언을 했다가, 수치심은 필자로부터만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씁쓸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그녀가 안쓰러워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지 모른다. 옆 사람에게 귀띔을 부탁한다고 해도, 오히려 나만 변태로 몰릴 수도 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단체 모임에 누군가가 꽤 특이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필자처럼 괜찮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웃는 사람도 있었고, 소위 빵 터진 사람도 있었다. 누가 뭐라든 이게 오늘의 내 패션이야 하는 강한 멘탈이 아니었던 그녀는 당황했다. 애써 괜찮은 척하는 그녀에게 30분 뒤쯤 어느 여성 멤버 한 명이 다가가 소곤거렸다.
-너, 이 패션은 정말 아니다. 안 하는게 낫겠어.
아마, 난 네 편이고, 널 위해서 진심으로 직언해주는 거고, 난 너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길로 직언을 당한 그녀는 모임에서 탈퇴해버렸다.
직언은 어렵다.
직언을 해주면 과연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 고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는 웹상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종원 교수의 인생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한다.
예컨대, 가족을 떠나 집 나와 버린 선배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직언해봤자 얻는 것은 없다. 선배의 미움만 살 것이다. 사실 자기 앞가림도 다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인데, 남한테 하는 직언이라는 게 오버인 면도 있다. 옷이나 스타일링은 자발적인 선택이고 자기표현인데, 거기다 대고 이상하다고 직언하는 건 우정에 금가는 일이다. 정치에서도 이번 사안만큼은 상대 진영의 말이 옳다고 직언하다가는 매장되기 십상이다.
돌출입이 심한데, 아무도 자기한테 돌출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환자들이 있다. 너무 착해서?, 너무 무서워서? 혹은, 아무도 그 사람 편이 아니어서?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너무 매력적이어서였을까? 그도 아니라면, 멘탈이 강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필자는, 외모를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것이 직업이다. 그러려고 성형외과에 온 것 아닌가? 세상에 심각한 돌출입은 없지만, 심한 돌출입은 있다. 돌출입이든, 광대뼈든 사각턱이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판단해드리려고 한다.
필자가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돌출입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직언을 통해 상처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돌출입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해드리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S대학병원 수술장의 신규간호사는 그 이후로 수술복 상의를 접어 클립을 꽂고 다녔다. 필자와 마주쳐도 인사 없이 쌩하고 지나갔다. 세월도 휑하니 지나고 말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녀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분명히 예쁘다고 느꼈었는데, 마스크 속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이 글을 보고, 그 때 그 신규가 자기였다고 필자를 찾아올 리는 절대 없겠지만, 만약 온다면 마흔 대여섯 살 쯤 되어 있을 것이다. 25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그녀가 사실 돌출입이라면, 이번에는 꼭 필요한 직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 상 백
현 서울제일 성형외과 원장
서울대 의학박사, 성형외과전문의
서울대 의대 준우등 졸업
서울대 의대 대학원 졸업 및 석,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병원 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서울대학교병원 우수전공의 표창(1996년)
전 서울대 의대초빙교수
저서 돌출입수술 교정 바로알기(명문출판사,2006)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대한 성형외과학회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강연
2018,2019 한국 및 타이완 성형외과 국제학술대회에서 돌출입수술 초청강연
20년간 돌출입수술과 얼굴뼈 수술 경력